(Blade Runner, Ridley Scott, USA, Hong Kong, UK, 1982)
디지털, 복제, 기술, 고도 발전 등의 키워드와 함께 영화를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 리들리 스콧 감독의 1982년 영화를 수업시간에야 처음 보게 되었다.
스타워즈 뺨치는 '미래 SF영화' 아우라를 풍기는 포스터를 타이틀 이미지로 쓰기에는 포스터가 영화를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연륜이 느껴지는 포스터를 보니 새삼 1980년대의 상상력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했나 새삼 감탄할 수 밖에 없다.
*간단한 줄거리.
때는 2019년, 다른 행성의 식민지배나 인간이 하기 힘든 각종 일들을 처리하는 용도로 보급된 '복제인간(Replicant)'. 가장 진화된 형태의 Nexus 6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고통에 대한 경험을 이식하여 스스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어있다. 그들을 제어하는 장치는 수명이 4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복제인간들의 반란이 시작하고, 이들을 잡고 제거(retirement)하는 특수 경찰이 블레이드 러너다.
- 2019년의 현대 도시는, 화려한 지금의 샹하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스카이폴에서 촬영된 상하이를 보니 말이다.)
- 80년대에 만연한 동아시아에 대한 우려와 공포는 과연 현실이 될까. 현재 진행형이다, 물론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으로 가득.
- 인간과 기계를 구분 할수 있는 것이 과거의 감정적인 경험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를 극복한 기계가 있다면 그것은 왜 인간이 아닌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의 '눈'에 대한 믿음.
- 사진을 확대하거나 영상통화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는 모습, 2015년의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영상통화를 하고 손으로 터치하여 사진을 확대한다.
-
영화가 던지는 몇 가지 질문들
1. 무엇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가.
결국 '인간성'에 대한 논의는 가장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서 부터 시작한다. 말트 하게너의 책에서 Voight-Kampff Test (복제인간과 인간을 구분하는 일련의 테스트)는 감정이입을 측정하여 감정이 없는 복제인간과 감정이입능력을 가진 인간을 구별하는 시험이다. "'눈'이 데카르트적 의미로 영혼과 진리의 기관이다. 진정한 인간과 인조인간을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 라고 하는 믿음마저 없다면 (이는 훗날 의심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실과 허상의 경계가 허물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사회는 가득차게 된다.
이러한 의심은 또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1) 이미 일어나고 있으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눈이나 육체로 판단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현대 사회의 우리는 기술과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으며 - 더욱이 무기를 들고 싸우거나 치고 받으며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눈이 보이지 않은 '폭력'은 폭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더 열정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기술의 세계에 편입시키려 한다. 예를들면 터치의 발전이나, 아이워치(손목), 구글 글라스(눈)으로 분명 디지털 시대에 '육체'의 의미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2) 그러나 현실과 허상의 경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 ; 다른 의미에서는 이데올로기가 무너진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디지털에 대한 (구시대적인) 유토피아적인 찬양이 아닌가? 예를 들면 벤야민이나 로라멀비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논의들은 이러한 '혁명'에 대한 희망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다.
3) 대다수의 SF영화에서 상상하고 있는 기계들이 감정을 키워 인간과 사랑을 나누거나, 심지어는 기계와 기계사이의 '로맨틱'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 것이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혼돈시키는 도구로서 이용되고는 하는데, 이 것 역시 기술에 대한 판타지에 불과하다. 기계가 인간의 형상을 하거나, 기계에게 감정을 주는 일은 현재 (2015)년의 기술로는 투자대비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며, 이는 인간과 구분되었지만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인간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무언가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공각기동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반기계 반인간이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애초에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현실과 비현실을 따지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
4) 복제인간들이 하고있는 고민 자체가 지금 시대의 인간의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진정한 감정과 기억을 원하고 사랑을 욕망하는 고민들은 인간의 것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때문에 이 영화는 관객들로 하여금 주인공인 '블레이드 러너' 보다도 결국엔 한정된 시간만을 살 수 있는 복제인간들에게 더 많은 수준의 동일시를 가능케한다. 영화의 전체적인 음악과 톤은 서정적이고 감성을 자극하는데, 이는 비단 주인공 블레이드 러너와 레이첼 커플만의 감정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로이와 프리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물씬 자극하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황에 더 쉽게 감정 이입하도록 한다.
2. 영화 전체를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
- 호루스의 눈? 프리메이슨 마크? $를 상징하는 피라미드와 눈 - 대놓고 자본주의 모티프?
- 오프닝의 폭발 이후의 눈-피라미드 시퀸스와 타이렐의 본사가 이집트의 신전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는 시점에서 이미 종교성이 드러나나, 그것이 영화의 본질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혹은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자체를 부정하고있는 것인지는 모호하다.
철저히 자본주의 하에서 계획된 미래도시의 모습. 예를 들자면 거대한 광고판은 현대의 모습과 다를바가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은 일본어+아시아어 가상으로 구성 된, 말하자면 '오리엔탈리즘'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방식으로 구성된 사회. 이는 80년대에 만연했던 과거의 제국 일본과 아시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기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영화에서는 반대로 아시아를 미래의 불안요소로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현대 사회가 이미 아시아(하지만 더 이상 일본이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의 권력하에서 재정렬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현실의 반증은 아닌가. 2015년의 상황은 아직은 모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4년 뒤, 2019년의 상황도 쉽게 상상할 수는 없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을 경우에 여전히 서구중심적인 (당연히, 서구의 영화는) 영화 제작 환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미래에 대한 우려를 그려내고 있을 것이다. 혹은 간사한 방식으로 중국 로케이션 촬영을 한다던가, 러시아와 중국과 힘을 합친다던가 하는 서사를 풀어내는데 30년전의 상상 속 권력구조가 어떻게 현실이 되어있는가를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큰 틀은 전혀 변화하지 않아서 더 개방이 되거나 자유를 찾았다기 보다도 상류층과 하류층 인간과 노예 일하는 사람들과 일을 시키는 사람들의 경계는 더욱 명확해졌고, 대중들은 여전히 우매한 대중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80년대의 영화이기때문에 가지는 한계점은 젠더관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특히나 전형적으로 아름답고 순종적인 여성상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플롯 - 다른 말로 이 영화의 로맨스플롯이 가장 고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3. 디지털 영화와 영화 소유
네번째로 영화를 보게 된 후에 다시 에세이 주제로 돌아오게 된다.
나의 네번의 관람은
1) 학교의 스크리닝 - 전혀 집중하지 못했다.
2) 집에서 첫번째로 다시 보게 됨. 플롯을 이해한다.
3) 다시 한번 노트북으로 화면을 캡쳐하면서 본다. 내가 좋아하는 장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모티브 등에 유의해서 보게 된다.
4) 커다란 스크린으로 영화의 리마스터링 버전을 보게 되는 경험. 압도적인 소리와 화면속에 나 자신을 완전히 몰입시킬 수 있다.
이러한 네번의 경험은 제프리가 주장했던 'Once is not enough'의 리서치와 상당부분 유사하다.
영화를 소유한다고 하는 개념은 여전히 모호;
하지만 이전에 알튀세르의 개념인 '호명'을 가지고 영화가 우리를 주체로서 호명시킨다 라고 하는 컨셉은 개개인이 영화를 멈추고 뒤로 돌리고 자를 수 있다고 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충분히 제어되거나 분절 될 수 있다.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 혹은 경향성이 생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유의미 하다. 그리고 이 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평가의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미루어 두자.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보고 또 볼 수록 슬퍼지는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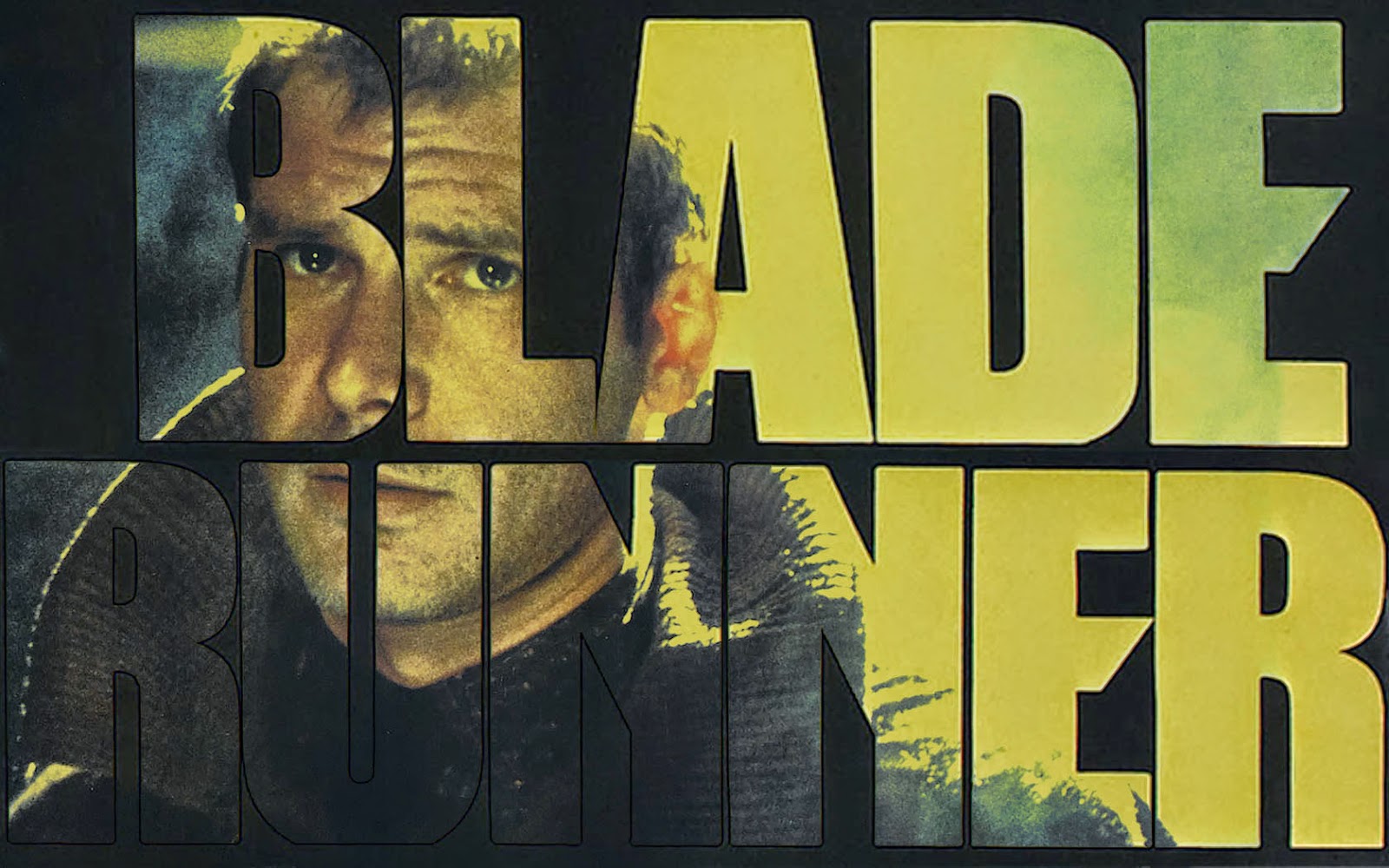





댓글 없음:
댓글 쓰기